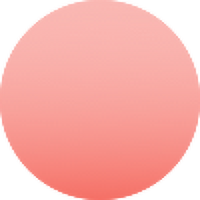사위는 백년손님이다
장모에게 사위는 백년손님이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지가 어느덧 십 년이 지났다.
연애시절 집사람 집에 처음 인사 갔을 때가 생각난다.
집사람과 나와의 만남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그 분위기도 냉랭하기만 했다.
그 당시만 해도 나는 직장에 갓 들어간 새내기이자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이라고는 새털만큼도 없었기에
나 또한 죄송함과 염치가 없는 마음이 들 정도였기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 장인어른은 네가 당신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해와 지속적인 사귐을
인정해 주시는 분위기였고 장모님은 어떤 남편을 만나야지만 몸고생 마음고생을 하지 않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장인어른 분위기와 어울리기에는 절대적으로 어색했다.
올해로 결혼 24주년이다.
장모님은 늘 네 걱정을 해주시고 가끔 뵐 때마다 따뜻한 얘기를 건네주시며, 집사람이 네 흉이라도 볼라치면 위로 아닌 위로도 해주신다. 사위는 백년손님이라서 그런 걸까?
사주명리의 관점에서 볼 때 장모님에게 사위는 편인(偏印)이라고 한다.
편인은 쉽게 얘기하면 잘 보살펴야 하는 대상이지만 이것저것 관계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대상이다.
예를 들어 친모를 정인(正印)이라 한다면 양모나 계모를 편인(偏印)이라 이해하면 될 것 같다.
하지만 장인어른에게 사위는 식신(食神)이라는 별이다.
식신은 그야말로 본인의 마음을 펼치고 본인의 활동력이 풍성해지고, 소위 오지랖도 많아지는 별, 상태를
말한다. 좀 이상하지 않은가.
사위는 백년손님이라고 했는데 사위 한 사람이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 전혀 다른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야말로 장모님에게는 손님이고 장인어른에게는 귀인인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사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관계성을 보여준다.
사위에게 장모님은 식신(食神)이라는 별이다.
식신이란 위에서 얘기했듯이 활동력이 풍성해지고 오지랖이 많아지는 별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장모는 사위에게 귀인인 것이다. 그리고 사위 입장에서는 장인어른은 정인(正印)이 된다.
사주명리에서 정인(正印)은 친모와 같은 마음과 관계성을 보여준다고 한다.
하지만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정인이라니,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위 입장에서는 장인은 정인이
맞는 것이다.
왜냐하면 장인어른은 사위(식신)에게 하소연도 하고 야단도 치고 술친구도 되어주고 때론 장모님 모르게
경제적인 도움도 주는 따뜻함과 배려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이제 “사위는 백년손님이다”를 사위입장, 장모님 입장, 장인어른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본다면
관계성에서 제일 불편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쉽게 알 수가 있다.
바로 장모님의 입장에서만 사위는 손님 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너무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사주명리학적으로 살펴볼 때 그러하다는 얘기다.
또한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사회경제는 부계 중심이었지만 가족경제는
모계 중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고치고 싶다. “장모에게 사위는 백년손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