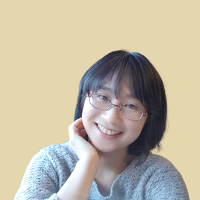선택을 했으면 꼭 해야 할 일
어른의 선택에 대하여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문 앞에 선다. 크게는 진로를 정하거나 배우자를 고를 때도 그렇지만 작게는 옷가게에서 어떤 디자인과 색깔의 옷을 살지도 다 선택의 문제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 내 손안에 들어오는 법이다. 그런데 선택을 유난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 역시 선택 앞에서는 꽤 신중한 편이다. 하나를 골랐을 때 뒤따를 여러 가능성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와 비교하느라 시간이 걸린다.
3년 반 전, 생애 처음 내 돈 주고 새 소파를 살 때가 떠오른다. 결혼한 지 13년 만의 일이었다. 한국 신혼집은 거실이 없어서 소파가 필요 없었고 미국에서는 전 세입자가 남기고 간 소파를 헐값에 사서 썼다. 그러다가 영국에서 내 집 마련을 한 후 드디어 내 마음에 드는 소파를 살 기회가 왔다. 행복한 선택의 순간이었다.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당시 유행하는 북유럽 스타일로 집을 꾸미고 싶었다. 겨우 3인용 소파 하나를 사는 것이었지만 백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 드는지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했다. 이런 가구야 한 번 사면 웬만해서는 바꾸지 않으니. 매일 온라인 숍에 진열된 소파를 보고 또 봤다. 오프라인 매장에도 여러 번 찾아가 색깔과 스타일, 가격을 비교했다. 한 달 정도가 흘렀을까. 드디어 내가 원하는 색과 스타일이 정해졌다. 팔걸이 부분이 폭신하며 앉았을 때 목까지 받쳐줄 수 있는 쿠션이 있고 원목 다리가 달린 회색 빛깔의 천 재질의 소파!
문제라면 이런 소파는 온오프라인 매장마다 몇 가지씩 있어서 어떤 것을 사야 할지 선택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남편은 소파는 알아서 사라고 결정권을 내게 넘겼지만 종종 "아이 있는 집에서 천보다는 가죽 소파가 낫지 않나?"라는 말을 흘리곤 했다.
어느 날 온 가족이 마트에 들렀다가 나의 권유로 바로 옆에 있는 큰 소파 매장에 들어갔다. 1, 2층으로 된 무지 큰 매장이었다. 나는 감격에 겨워 몇 바퀴도 돌 수 있을 마음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남편과 딸들이 어떤 밝은 갈색 가죽 소파에 앉아보고는 그걸 사면 어떻겠냐고 했다. 오우 노우.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하지만 아이들은 소파에 앉아 떠날 줄 몰랐다. 남편이 가죽 소파의 장점을 읊기 작했다. 자꾸 나에게 앉아 보라고 권했다. 앉았다. 편하긴 했다. 언제 왔는지 매장 직원은 우리 옆에 붙어 그 소파가 할인에 들어갔다고 알려주며 베스트셀러라 했다. 오우, 안 되는데....... 내가 사고 싶은 건 이게 아닌데.......
그날은 귀신에 홀린 게 분명했다. 한 달 이상 고민해 온 나의 스타일도 아니면서, 분위기에 떠밀려, 순간의 멘붕에 기대어, “예스”를 외치고 말았던 것이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소파 값을 지불하고 배송 받을 날짜까지 확정한 상태였다.
문제는 그다음부터 일어났다. 마음속 폭풍이 날마다 몰아쳤다. 내가 미쳤구나. 이를 어쩌지. 지금이라도 취소할까. 그래도 직접 놔 보면 예쁘지 않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느라 시간은 흘러버렸고 결국 소파를 받고야 말았다. 쿠션감은 좋았으나 역시 디자인과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폭풍이 가라앉지 않았다. 매일 후회했다. 화가 났다. 그런 소파를 추천하고 사자고 했던 가족들에게 화가 났다. 하지만 가장 큰 화의 대상은 나 자신에게였다. 내가 안 산다고 했으면 남편도 그러자고 했을 것이다. 나의 선택에 너무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죽 소파와 함께 하면서 후회와 화는 누그러들었지만 여전히 볼 때마다 회색 천 소파가 더 어울렸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날 나는 왜 마음에도 없는 동의를 했을까? 선택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기가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나 같은 이들에게 그것이 온전히 스스로의 몫이라는 건 무척 부담스러운 일이다.
한편으로는 부모가 이끄는 데로, 사회가 가란 데로 걷는 게 익숙해진 우리들은 무언가 본인의 의지대로 정하는 게 익숙하지 않기도 하다. 모두가 북유럽식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갈색 가죽 소파는 나에게 정답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답을 고를 용기도 없어 가족들의 손에 펜을 쥐게 해 놓고는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징징거렸다니, 도대체 철든 어른은 언제 되는 걸까.
살다 보면 후회할 일이 많이 생긴다. 확신에 차서 한 선택에도 후회를 하는데 하물며 나처럼 주관도 없이 어쩌다 하게 된 선택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 후회란 것도 감정 소모가 쾌 큰 일이다. 뿐만 아니라 시간도 들기 때문에 후회를 하고 있자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물론 누구나 후회를 하며 산다. 그것을 통해서 다음 선택을 현명하게 하는 지혜를 배울 수도 있다. 하지만 짧게 끝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 신화에 오르페우스라는 영웅이 있다. 시인이자 악사, 가수였다. 여신 에우리디케와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그녀가 뱀에게 물려 죽게 된다. 오르페우스는 그녀를 이승으로 데려오기 위해 저승을 내려갔다. 그곳에서 그의 음악에 반한 지하 세계의 왕 하데스가 딱 한 번의 기회를 준다. 이승으로 나가는 출구까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고서 말이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헬부른 궁전에 있는 오르페우스 동굴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헬부른 궁전에 있는 오르페우스 동굴오르페우스는 약속을 잘 지키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출구 앞에서 에우리디케가 잘 따라왔는지 잠깐 돌아보고 말았다. 순간 그녀는 다시 저승으로 빨려 들어가 사라져 버렸다.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선택에 후회를 하며 뒤를 돌아보는 순간 우리의 시간, 오늘, 지금 이 순간은 에우리디케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일단 선택을 했다면 돌아보지 않는 게 상책이다. 오르페우스가 되는 우를 범하지 말자. 갈색 소파를 사랑하자! 선택은 책임이 따르는 일임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