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일기] 만병통치약
아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
by
Aug 28. 2019
울보인 첫째는 여린듯하면서 강한 면이 있고
강해 보이는 둘째는 생각보다 여린 감성을 지니고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강자 앞에 강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자 앞에서 강하다.
싹싹한 8세 어린이는 목욕을 시켜주는 엄마에게
"엄마는 참 친절해.. 우리 목욕도 시켜주고 내가 아프면 치료도 해주잖아."
세상의 거의 모든 엄마들은 자기 자식이 아프면 치료해주고 싶고 또 실제로 치료해준다.
나보다 더 잘하고 더 친절한 엄마들도 많은데...
나의 딸은 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왜 엄마는 가끔 화도 내고 무섭게 말하기도 하잖아."
"그렇지만 엄마는 우리가 아플 때 우리를 보살펴주고, 우리에게 맛있는 것도 해주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좋아요."

(알긴 아는 거니...?)
사실 내가 아이들에게 하는 행동들이 별로 특별한 일들은 아닌데...
그것을 내 아이가 고마워한다니 엄마로서는 뿌듯하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마운 거에 고맙다 말해주는 게 너무 예쁘고 고마웠다.
우리 떼쟁이 둘째는 언니보다 강하다.
아직 5살밖에 안됐지만 모든 일에 씩씩하고 야무지다.
첫째가 등교하고 난 후 늦잠 자는 둘째를 깨우기 위해 침실로 다가간다.
어젯밤에는 '잠이 안 와' 노래를 부르던 둘째 건만 아침엔 '일어날 수 없다'로 버티며 자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막내가 그러하듯이...
우리 집도 막내라 사랑스럽다.
우리 집 제일 쪼그만 쪼꼬미.
아직 덜 자란 손과 축축하게 젖은 땀냄새 또한 아기라서 귀여운 막내.
엉덩이를 토닥거리고, 등도 긁어주고, 얼굴도 비벼대고, 뽀뽀도 실 것 한다.
딸아이가 좋아하는 알라딘 노래도 틀어보고, 기분이 나쁘지 않게 깨워보기 위해 열심히 시끄럽게 군다.
에라 모르겠다.
딸아이를 번쩍 들어서 배 위로 올렸다.
눈도 안 뜨고 반대로 내려간다.
얼른 쫓아가서 등에 찰싹 매달린다.
싫다고 1차 짜증을 낸다.

모른 척 더더 들러붙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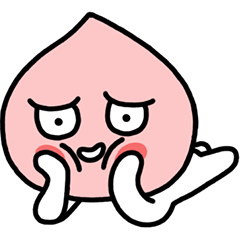
싫다고 2차 짜증과 함께 발길질이 날아왔다.

"아이고야.. 아이고 내 발이야."
나는 있는 힘껏 소리친다.
딸아이가 번쩍 눈을 뜬다.
이때다 싶어 아껴온 열연을 펼쳐본다.
(사실 진짜 세게 차서 아팠다.)
"엄마 발을 빵 차서 너무 아파... 엉엉엉"

내가 우는 시늉을 하자 딸아이는 무안해하며 내 발에 바람을 불며 호호 거린다.
"그래도 너무 아파."
엄살을 피우는 내게 딸아이가 제안을 하나 한다.

"엄마 내가 아까 발로 찬 거 가슴에서 지워."
"가슴에서 지워?"
"응 잊어버려."
"잊어버리면 서윤이는 엄마한테 모해줄 건데?"
"뽀뽀"

만병통치약 '뽀뽀' 한방에 다리 아픈 건 싹 다 지우기로 했다.

말 한마디에 녹아내리고
뽀뽀 한 방에 무너지는 나는야 약한 엄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