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과 엄마의 역할
초등 저학년 (1)
초등학교 입학통지서를 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영 실감이 나질 않았는데, 예비소집에 다녀오고 나니, '드디어, 울 아들이 초등학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초등학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 배정되는 것이라서 "선택"의 범주에 들지 않지만, 우리는 일상에 변화가 생겨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
"(20년 만에) 다시 쓰는 육아/교육일기 2"에서 언급했다시피, 친정에서 분가하면서 얻은 집의 전세만기가 돌아와 재연장이냐, 이사냐, 이사면 어디로 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적어도 6년,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한 곳에 정착하길 바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신중을 기했다. 내 경험상 "전학"은 좋은 기억이 아니어서 가능한 한 아이에게 안정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깊은 고민 끝에, 우리는 신접살림을 차렸던 대구로 다시 나가기로 결정했다.
일단, 우리가 선택한 지역은 전국적으로 학구열이 높다는 수성구에 속해 있기도 했고(물론 중심은 아니었지만), 친정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곳과도 그리 멀지 않았다. 혹시나 일이 생길 경우,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만한 거리였다.
또, 내 생각에, 아이가 이곳에서 잘 적응해 준다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적어도 12년간은 아이의 교육에 최적인 장소라고 생각했다(그때는...). 그래서, "아이의 교육을 최우선으로 하자."라고 울 신랑을 설득해 대구로 이사를 나왔다(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이미 초등학교 배정이 끝난 상황이었지만,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다시 학교를 배정받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울 아들도 새롭게 배정받은 초등학교에 입학해 별 무리 없이 친구들과 어울리고 학교생활을 잘해나갔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난 후, 초보 학부모가 된 나는 '이제, 아이를 위해서 뭘 해야 하나?', '뭘 해주는 게 아이에게 도움이 되려나?' 하는 고민을 했던 것 같다. 그러자, 주변에서 "엄마들과 교류하며 정보를 많이 모으라."는 조언을 해주었다. "엄마의 역할은 정보수집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일단, 내가 학교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데라고는 아이가 가져다주는 가정통신문, 아이가 들려주는 학교생활, 그리고 아이 하교를 기다리며 초등학교 정문에 홀로 서 있는 동안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하는 것을 귀동냥으로 주워듣는 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다른 엄마들은 같은 유치원을 다녔거나, 같은 아파트 거나 해서 이미 공감대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반해, 나는 이곳이 낯선 곳이다 보니,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말주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는 성격도 아니어서 소외감도 느껴지고 뻘쭘하기도 하고 답답함도 느껴졌다. 딱 "이방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의 정보력이 중요하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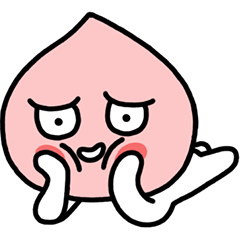
그 당시 정보를 왜 모아야 하는지, 정보를 얻어서 어디다 쓰는지도 잘 모르면서, 막연히 아이의 학교생활을 알고 싶고, 아이가 공부하는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은 알아둬서 나쁠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 고민 끝에 학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돌파구를 스스로 찾기 시작했다.
우선, 학교에서 주최하는 공식적인 학부모 행사에 적극 참여했다.
학교에서 하는 공개수업, 학부모 회의, 부모님 자원봉사(교통 지도, 청소 도우미 등) 등 학교에서 학부모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일단 시간을 내서 참여했다. 엄마들이 서로 미루는 일들도 나서서 하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 눈에 띄었는지, 학부모 운영위원 자리 하나가 공석이 되자 추천을 해주셔서 학교 운영에 깊숙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학부모 운영위원이 되자 선생님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졌다. 아이의 교우관계, 학습적인 상황, 학교 생활 등에 대해 선생님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다. 내가 일부러 선생님을 찾아간다거나 하지 않아도 학교에 나갈 일이 많아지고, 회의가 있다 보니 정기적으로 선생님을 뵙게 되어 학교 및 아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학부모 운영위원이 되자, 다른 학부모님들과의 교류도 잦아졌다.
3월이 지나, 1학년 반모임이 생겼는데도, 내 성격상 너무 부담되는 자리라 가고는 싶지만,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OO이 엄마가 학부모 운영위원이 되었다."는 소문이 나자마자, 학교 정보를 얻고자 하는 엄마들이 내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다. 그 이후 정보를 주고받는 사이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고, 반 모임에도 빠짐없이 참석해 "이방인"의 딱지를 떼어냈다.
나와 달리, 아이의 학교 생활은 시작부터 순조로웠다.
아이들과 쉽게 친해졌고 잘 어울렸으며 학습적인 부분도 뒤떨어지지 않았다. 아니, 잘하는 편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친구들의 생일파티에 초대를 많이 받았다.
그런데, 그 당시 생일파티는 초등학교 1학년이라 그랬던 건지, 아니면 그 지역의 룰이 그랬던 건지 초대받은 아이들의 엄마들도 함께 참여하는 생일파티를 열었다.
아이가 친구들로부터 초대를 받아오는데, 내가 거절할 수는 없어서 쭈뼛거리며 같이 참석을 했는데, 울아들 눈에 내가 그런 모임을 싫어한다는 게 보였던 모양이다.
친구의 생일파티에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초대를 받았던 어느 날, 아이가 내게 초대장을 내밀며 이렇게 말하는 거였다.
"엄마가 힘들면, 나 혼자 갔다 와도 돼요."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함께 참석할 텐데,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울 아들이 내 모습에 많이 불편했겠구나 싶어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이로부터 배운다고 했던가? 아이의 말 한마디에 깨달음을 얻은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최소한 같은 반 엄마들과는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에 반 모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 같다.
[에필로그]
"아이의 교육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내 주장으로 이사를 하고 난 후, 아이 아빠도 박사학위를 취득해 본격적으로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하면서 출퇴근에 어려움이 생겼다.
출퇴근버스가 집 근처까지 오긴 했지만, 첫 경유지여서 새벽 5시 30분에 출근버스가 왔고, 칼퇴를 해도 퇴근시간이 7시 반을 훌쩍 넘겼다. 그리고 야근도 잦아 아이가 아빠 얼굴을 보지 못하는 날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이가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아빠는 안 계셨고, 아이가 잠들기 전까지 퇴근을 못하는 날들이 생겼다.
"아빠, 언제 와요? 너무 보고 싶어요."
한 집에 살면서 아빠를 자주 못 봐 그리워하는 일이 생기다니...

그래서 아빠가 퇴근하면 볼 수 있게, 하고 싶은 이야길 포스트잇에 적어 냉장고에 붙여두자고 했다.
그날부터 아빠와 아들의 쪽지주고받기가 시작되었다.
아이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부분 짤막하게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라고 썼지만, 아빠는 아이에게 힘이 되어 주는 글, 사랑을 듬뿍 담은 글들을 남겨주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된 부자간의 LOVE LETTER는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아빠의 귀가가 늦어질 때마다 남겨져 아이가 아침마다 아빠의 쪽지를 찾아 읽어보는 작은 이벤트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