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의 가장 고상한 살인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결말
왜 서민들이 다시 굶주리고, 금융회사들은 살아날까?
실업률이 1% 높아지면 자살률은 1.3%가 올라갑니다.
Are Recessions Good For Your Health?이라는 논문에서 christopher ruhm 교수가 한 말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전세계적으로 실업률을 높였습니다.
자연히 자살률도 높아졌죠.


하지만 정작 문제를 일으킨 월스트리트의 금융인들은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 이미 엄청난 백만달러 단위의 인센티브로 돈을 모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도산한 각 기업의 금융인 및 CEO들은 각자 대학교수 컨설턴트, 다른 금융회사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다니고 있죠.


영화 인사이드잡에 비친 "주범"들의 모습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정장을 말끔히 빼입고 아직 바쁜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인터뷰에 할애해주는 수준이었죠. 해고 당시 그들의 걱정은 더이상 요트를 사거나 스트립클럽과 도박을 즐기던 "금융파티"가 끝났다는 정도였을겁니다.
영화 마진콜을 보면, 백만달러단위의 인센티브를 받던 금융인들이 MBS를 빠르게 팔아넘기고 두둑한 퇴직금을 받으며 퇴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가 개인 헬리콥터 혹은 수상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흔할 정도였죠.


정작 손해를 본 쪽은 월스트리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노동자들입니다. 사고 이후 실업률은 급격히 상승했고 미국에서만 82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했죠. 집을 차압당한 이들은 모텔의 단기숙박을 전전하거나 텐트에서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을 중국의 노동자 1000만명도 실직했죠.
그런데 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실업률의 상승까지 이어지게 된까요?
앞선 포스팅에서 말했듯이 서브프라임 론의 상환률이 하락은 MBS, CDO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지는데에는 특정 단체와의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종합적으로 발생하는데요. 투자자들은 이제 금, 엔화,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을 선호하게됩니다. 자연히 달러값은 급등하고, 자금시장은 위축되며, 금융기관은 줄줄이 파산합니다. 증시도 폭락하죠. 이러한 일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에게 (시장경제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시너지를 일으키며 경제공황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왜... 짤렸냐고..?
좀 더 직접적인 원인만 짚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하락이 개인에게 끼치는 영향
잘못없는 사람들의 실직
1. 서브프라임 사태 이전

부품구매, 인건비, 광고비, R&D 등 기업활동에는 현금이 꼭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주식, 채권, 어음발행을 통해 그 현금을 확보하죠. 특히 어음(CP)의 경우 짧게 돈을 빌리는 용도기 때문에 부품구매나 인건비 제공에 주로 활용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노동을 제공합니다. 이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서비스는 "근로자의 다른 이름인 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는 셈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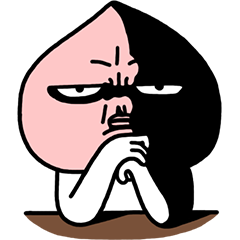
그런데 은행의 건강이 나빠지면 이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2.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레버리지가 33:1에 달했던 당시의 투자은행들은 단 3%의 손실만으로도 자본이 모두 날라갔습니다. 자본이 부족한 투자은행들은 3~10년 후에 받기로 한 기업의 채권에 대해 조기상환을 요구합니다. 기업은 이를 상환하고 자본이 부족해지죠. 더군다나 안전자본으로 떠나는 주주들로 인해 주가는 하락하고 이는 기업의 자본부족상태를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자본 없이 부채더미에 앉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돈을 주기 위해선 결국 기업어음을 발행해야 할텐데요. 문제는 시중은행도 CDO의 가치하락으로 현금이 고갈됐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업어음을 매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기업어음(CP)를 매입할 곳이 없어지자 기업은 인력/부품구매등을 할수 없어졌고 이는 기업들의 구조조정 혹은 파산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업에 부품을 제공하던 중국의 제조사들 또한 연달아 무너질수밖에 없었죠.
이는 근로자이자 소비자인 개인들의 소비력을 떨어뜨렸고, 기업은 다시 매출을 올릴 수 없고, 이는 다시 주가하락으로, 또다시 구조조정의 악순환이 생겨버린 것이죠.
실업률이 펑펑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결국 세금을 쏟아부었죠.
"금융회사에"

응?
왜 막상 죽어나가는 개인들을 살리지 않고,
그 개인들의 돈으로 금융회사를 살리는거죠?
TOO BIG TO FAIL
망하지 않는 금융회사들
 Too big to fail
Too big to fail금융 및 기업에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라는 말이 있습니다.
덩치가 너무 큰 기업(및 은행)은 파산할 경우 그 여파가 나라 경제 전체로 퍼져나가 경제공황을 초래할지도 모르는데요. 이들은 고용인원도 많고 자산규모도 커서 이들이 몰락은 앞선 [기업-개인-은행-투자자]의 관계를 심각하게 깨뜨리고 연쇄적인 기업들의 몰락을 낳게 됩니다. 결국 정부는 나라 전체적인 경제공황을 막기위해 막대한 세금을 투자하여 문제의 회사들을 살려야하죠.
 결국 세금으로 메꿔야 할 기업들의 부채
결국 세금으로 메꿔야 할 기업들의 부채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기업들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로비행위를 통해 레버리지를 올려가며 공격적이고 위험한 투자를 한 것 역시 "망하면 나라가 살려줄텐데"에 기반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진짜 피해를 본 국민들의 세금이 가해자인 투자은행들에게 들어가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분명 사태의 원인은 대부분 금융회사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죽어나가는 것은 원인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입니다.

미국의 살인 피의자는 저소득층과 유색인종, 저학력자가 대다수를 차지한다고합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처벌받고, 감옥에 갑니다.
하지만 살인은 칼이나 총으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죠.
월스트리트는 돈과 정보격차라는 도구로 고상한 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명할 수 없는 고상한 살인이 측정될 수 있다면,
저 데이터가 조금 다른 결과를 낳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10년마다 경제공황이 반복되고 있는 지금,
시스템의 문제를 인정하고 변화해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경제학쪽 글보다는 기업분석을 쓰고자 만든 브런치인데..
주제가 꽤나 흥미로워서 계속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네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 대한 이야기는
[빅쇼트 : 천재와 사기꾼 사이의 골드만삭스]와
[서브프라임과 IMF, IT버블과 비트코인의 평행이론]으로 마무리 할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