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함과 부드러움의 방향 (0911)
부드러움 & 따뜻함 편, 날마다 욕구명상(OO일째)
by
Sep 12. 2021
1.
부드러움과 따뜻함에 대하여
끄적인 것들.


2.
두 개를 같이보니 알게된 것이 있다.
상상 인터뷰로 정리해 본다. (1인2역 중)
(1인 2역 인터뷰 시~작)
Q. 이 욕구들이 선생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음..
(수줍은 듯 입을 가리고 내숭을 떨며)
저는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
제 강점이라는 평가를 들어왔어요.
Q. 그래도 인간이라면 항상 그럴수는 없지 않나요?
당연히 저에게도 '거침'이 있고 '인색함'과 '냉담함'이 있죠.
(손사래를 치며)
옛날에는 그걸 어떻게 다룰줄을 몰랐어요.
혼자서 속앓이를 하거나
원래부터 없는척했던 것 같아요.
외면한거죠.
겉으로 드러나지를 않으니
호박씨 깐셈이기도 하고요.
요즘 와서야
뾰족한 것들을
혼잣말로 뱉어내거나
글로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요즘엔 혼자 욕도 잘하고,
혼자 욕도 잘 써요.
한마디로 똥으로 싸버리는거죠!
즉시 상대한테 하는게 아니라
나 혼자 소화를 일단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상대를 만나면
훨씬 부드럽고 따뜻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방법을 알게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배출을 안하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건강이상으로 가거나 ~
성격파탄으로 가거나~
얼굴 인상으로 가거나~
집에 있는 애 갑자기 쳐 잡거나~
원래부터 그랬던 남편한테 오늘따라 ㅈㄹ하거나~
어디로 분명 가겠죠.
Q. 이 욕구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안타까움을 느끼신다고요?
맞아요.
(우수에 찬 눈빛. 슬픈 표정으로)
제가 이 욕구들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민감한건 사실 ....
엄청난 능력이 될 수도 있는건데...
종이 한장 차이로
그저 '초 예민함'이 되버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좀..
날선 말투, 정제되지 않은 행동, 거친 생각이나
냉랭한 표정, 공동체 안의 차가운 분위기?
뭐 그런 거에 잘 눌려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제가 어느새 알아서 기고 있고요.
한마디로 필요 이상으로 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쫄고 있는 내가 짜증이 나서
상대를 속으로 비난해요.
"왜 말이나 행동을 저렇게 밖에 못해?"
하면서요.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없다고 남을 비난하다가
나조차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너무 역설적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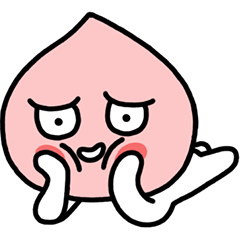
저는 좀 제가 이런 것에
배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타인에게는 부드럽고 따뜻하되,
남의 부드럽고 따뜻하지 못함에 대해서는 담대한,
그런거요.
따뜻함이 뾰족함을 덮어버리고도 남는.
그런거요.
쉽게 예민해져 버리는 제가 아쉬워요.
Q. 이번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아... 음..그런데요.
방금 말한 거요.
제가 말하고도 마음에 '툭' 걸리네요.
'내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배짱이 있었으면 좋겠고~어쨌으면 좋겠고,~저랬으면 좋겠고' 이 생각이요.
방금 알아차린 건데.
또 방금 스스로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어요.
또 그랬네요.
제가 자주그래요.
나도 불완전한 존재고
나도 늘 괜찮을 수 없는데
더 나아지고 싶어하고
뭔가 달라지고 싶어하고
더.더.더.
그래요.
제 안에 칼같은 완벽주의자가 살거든요.
하도 제 삶에 자주 등장해서
Mr. Gray,
라고 이름까지 붙였다니까요.

<- 이렇게 생김.
이 Mr. Gray가 출동하면
시도때도 없이 얼마나 저를 채찍질하는지 몰라요.
저는 사는 동안
의무감과 책임감이 많은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런 편이에요.
옛날에는 모르고 그랬고,
지금은 알고도 그래요.
학교다닐 때 생활기록부에 선생님들의 평가가
매해 이렇게 시작할 정도였으니까요.
"책임감이 강하고~~~~"
그런데 스스로를 너무 엄하게 대하면
사는게 피곤해지고
재미가 없어지대요?
요즘도,
저는 엄마 역할을 제가 너무 잘하고싶어한다는 걸 자주 알아차려요.
good enough mother만 되면 된다고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도
자주 죄책감과 부담감과 의무감을 느껴요.
그래서 아이와 누릴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아차! 하고 놓칠때가 있어요.
또 다시 "(엄마 버전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삶을 반복하고 있는거죠.
그래서,
의무감으로 하는거.
책임감으로 하는거.
부담감으로 하는거.
제 삶에서 다 갖다 버리고요.
진짜 마음이 동해서 하는 것들만
체로 걸러 남겨보려 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
최고로 부드럽게 대해주는 거
나 자신을
최고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
앞으로 이거 잘하며 살고싶어요.
부드럽고 따뜻함의 방향을
좀 더 나에게로 쏟으며 살고싶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느 방향이 '성숙'으로 가는 길인지는요.
저는 밖으로 향하는 건
하지 말라고 해도 지나치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안쪽으로 할래요.
기자님도 꼭
자신의 부드러움과 따뜻함의 '방향'에 대해 알게되시기를 바래요.
Q. 네~저도 한번 생각해봐야 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