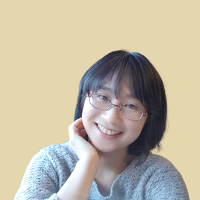화장품과 행복의 유통기한
어느날 아침, 산책을 나서려다 햇볕이 강해 선크림을 바르고 가기로 했다. 2년 반 전, 한국 갔다가 사온 크림을 찾아 쭈욱 짜서 얼굴에 펴 바르다가 무심코 유통기한을 확인했다. 어라? 1개월쯤 남았네? 하지만 안심할 게 아니었다. 화장품의 특성상 뚜껑을 한 번 열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다 써야 한다. 그 크림은 12개월이라고 되어 있었으니 사실은 작년 여름에도 쓰면 안 되는 것이었다. 기한이 지난 화장품에 세균이 득실거린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났다. 갑자기 얼굴에 세균 크림을 바른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눈살이 찌푸려졌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선크림 한 통을 다 써 본 적이 없다. 친구들이 우리 나이는 피부 관리를 잘해야 한다며 겨울에도 외출할 때 꼭 바르라는 충고를 하긴 했지만 외모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나에게 그것은 여름에만 잠깐 바르는 물건이기에 항상 남아돌았다. 그러다가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걸 확인하면 어쩔 수 없이 버리고는 했다.
문득 작년에 영국에 여행 온 후배가 선물하고 간 새 선크림이 생각났다. 찾아보니 그것은 몇 개월 전에 내가 넣어둔 서랍 속에 잘 누워 있었다. 유통기한부터 확인했다. 세상에. 2개월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급한 마음에 쓰던 것을 얼른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것을 뜯었다. 화장실로 달려가 세수를 한 후 얼굴을 비롯해 옷으로 가려지지 않은 팔과 목 부위까지 구석구석 듬뿍 발랐다. 두 달 후에는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선크림을 조금이라도 더 써 보고자 딸의 얼굴에도 발라 주었다. 얼마나 많이 짰던지, 펴 바를수록 피부로 스며드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하얗게 뭉쳐서 없어질 때까지 문지르느라 팔이 아플 지경이 되었다.
살면서 이런 상황이 자주 펼쳐졌다. 특히 유통기한이 있는 화장품류나 식품류를 다룰 때면 “쓰던 거 다 쓰고 새 거 써야지”, “아까워서 어떻게 버려”하면서 뭉그적거리다 항상 상태가 안 좋은 걸 바르고 먹었다.
한 번은 친구에게 스킨 토너를 선물 받은 적이 있었다. 몇 개월 뒤에 다른 친구가 그것을 또 선물했다. 갑자기 스킨 토너 부자가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 나는 그저 사용하던 것 먼저 쓰고 새것을 열고 싶었을 뿐인데 그러는 동안 선물 받은 것 두 개 모두 유통기한이 지나버렸다. 할 수 없이 지난 채로 하나를 쓰기 시작했고 다른 하나는 몇 개월 뒤, 결국 냄새까지 이상해져 버려야 했다.
아껴야 잘 산다. 그러나 이미 내 손에 들어와 있는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면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선물 받은 선크림과 스킨 토너를 받자마자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내 피부는 조금이라도 더 신선한 화장품을 바르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지 않았기에 나는 유통기한이 지난 혹은 임박한 것을 써야 했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 행복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신선한 것일수록 좋다. 어제의 행복이 오늘과 내일까지 이어지리란 법이 없다. 지난 행복을 끌어와 쓰려고 하다가는 오늘 새롭게 주어진 행복을 잃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지금 누려야 할 행복은 마음껏 누리고 하루를 마감하도록. 특히 같은 종류의 화장품이 여러 개라면 유통기한 짧은 건 가차 없이 버리는 게 남는 장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