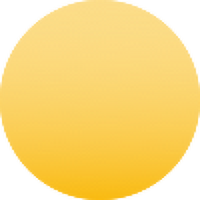임철우, 『백년여관』
읽기 전에 얻은 풍월과 제목만으로 기대했던 혹은 예상했던 것은 한국 근현대사 100년 동안 생겨난 원혼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신학철이 <한국현대사> 같은 작품을 통해 이러한 원혼들을 시각화했다면,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들을 서사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읽어가면서 이야기의 전개 속도에 비해 남은 책장은 많지 않아서 그 정도 스케일이 될 수는 없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 조금은 실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과 죽음이 뒤얽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사는 세계가 우리의 것만이 아님을 생각하게 하는 작가의 힘은 대단했다.
『봄날』이 당대의 사실을 증언하고 재현하는 것에 방점이 있었다면, 백년여관은 그 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작가 스스로 쓰지 않을 수 없던 이야기, 써야만 했던 이야기이다. 그는 아마 『봄날』 만으로는 부채의식을 상환하기에 미진하다고 여겼던 것 같다.
그런데 작가가 보여준 세계는 저 땅끝의 섬에 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지방의 현실이라고 해야 할까? 도시에서는 이러한 중음(中陰)의 삶을 잊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과거의 지방에서뿐만 아니라 현재의 도시에서도 이러한 죽음이 살아 숨쉬고 있으며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많은 철거민, 참사 희생자, 자살자, 고독사, 노숙인, 온갖 밀려난 자들의 원혼이 있다. 갖가지 방식으로 죽어 사라진 자들의 존재를 가시화하는 서사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작품의 문제의식이나 그것을 서사적으로 구현해내는 능력과는 별개로, 감각적으로 거부감이 든 대목이 있었다. "평생의 고독과 절망이 응고된" 고통스런 기억에 몸부림치는 요안을 달래고 진정시키는 것이 조천댁의 "눈부시게 뽀얀" 젖가슴이라니(301). "어린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던" "희디흰 젖가슴"에 대한 향수, "그 한없이 부드럽고 풍요로운 모성의 젖가슴"이 세상의 질곡에 시달린 모든 이를 품어줄 수 있으리라는 중년 남성들의 환상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