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 직박구리
매일줄넘기134일째
by
Jan 4. 2025
눈앞에 장애물 없이 바로 보이는 나무.
화난 듯 수많은 갈빗대 같은 손 끝이 일제히 하늘을 가리키고 있다.
나뭇잎은 단 한 개도 없는 겨울 은행나무.
조금은 음침해 보이는 수많은 가지들 사이에 한 마리의 새가 푸드덕 "빼액"소리 내며 왔다.
주먹만 한 회색 새가 몸과 경계 없는 목을 요리조리 각지게 바꾸며 갈빗대에 앉아있다.
고개의 각도를 바꿀 때마다 촘촘한 회색털이 가닥가닥 윤기 나게 반질 빛났다.
새의 꼬리는 짧은 똑 단발을 고무줄로 간신히 묶은 듯 곧곧이 힘 있게 공중에서 살아 뻗어있었다.
부리를 나뭇가지에 오른쪽 왼쪽 부딪쳐 긁으며 몸단장을 하는지 가려움을 해소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나름 시원해 보였다.
새와 나. 둘만 있다.
목표지점이 정해지지 않았는지 아직 단장 중인지 또한 알 수 는없지만 많은 가지들 사이의 은행나무에 홀로 앉아있는 회색 주먹만 한 새와 그 밑에서 혼자 줄을 돌리는 나와 위아래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본다.
줄넘기하는 나를 구경하는 것 같다. 계속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 방금 몇 분 지나지 않은 처음 보는 사이지만 줄넘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으면 하는 뜻모름 바람? 부탁하고 싶은 별난 마음이 품어진다.
새가 앉아있는 나무의 갈빗대가 가냘프지만 그래도 있을 것은 다 있는 새에 반응하며 살짝씩 흔들렸다.
나는 얼굴을 뒤로 졎혀 새를 올려다보고 새는 머리를 조아리듯 내려다본다.
즉시 내가 있는 곳은 아래가 되고 새가 있는 곳은 위가 된다.
눈에 담긴 풍경이 서로 다르기에 눈이 마주친다.
내 눈에는 새가 새눈에는 내가.
줄넘기를 하는 이 순간. 마스크 안에서 오늘도 강풍의 히터가 나온다. 소용돌이가 오늘 더 세다.
콧잔등이 먼지가 붙은 것처럼 간지럽다.
나는 검은색 옷을 새는 회색 옷을 입었네... 생각하며 발가락에 줄이 걸리지 않으려 집중하고 있던 순간 갑자기 공허한 기분이 들며 허전해졌다.
오늘 처음 본, 지금 순간, 공간을 함께 했던 새가 어디론가 가버렸다. 어디로 갔을까..?
대화도 해본 적 없고 처음 보는 사이지만 넌지시 기척이라도 하고 가지.. 알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서운함이 내 줄넘기 동작의 그림자에 함께 녹아든다.
주먹만 한 회색 새는 빽빽하게 얼어붙은 아침하늘을 부지런함으로 헤집어 놓으며 먼저 하늘길을 색칠해 주었다.
나도 줄넘기로 오돌오돌 떨며, 이를 부딪히며 아침 땅 공기를 줄넘기 손을 잡고 헤집어 놓았다.
색다른 행복감이 전해진다.
새는 어떻게 몸뚱이 전체를 마중물도 없이, 준비 시동도 없이 가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바로 휙 몸을 들어 올려 날 수 있을까?
올 때는 푸드덕 "빼액" 왔다고 알려주더니 갈 때는 기척도 없이 가서 서운한지도 모르겠다.
함께한 기억의 잔상으로 찾아보았다.
직박구리였다.
줄넘기할 때 한 동안은 그 은행나무를 유심히 보게 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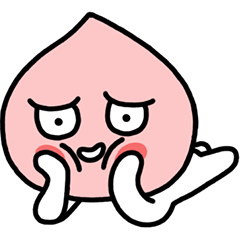
Brunch Book 수, 토
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