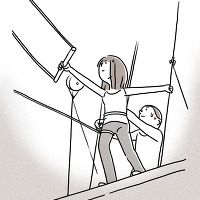소설 _ 17. 파도와 같이
소설 _ Flight to Denmark 17.
다음 날 나는 아침에 보는 소박하고 환한 형석의 집이 부끄럼 없이 내가 머물 곳인 양 안전하고 익숙하게 느껴졌다.
잠깐 생각했다. 어제 나를 이곳으로 내 달리게 했던 캄캄한 밤이 있기는 했던가?
하지만 형석이 미소를 지으며 나를 깨우고 주방으로 들어가자 지난밤, 인적 없는 강변에서 내게 기대어 울던 이차은의 남편이 떠올랐다.
어쩌면 어젯밤 내가 그토록 사력을 다해 형석에게 달려온 것은 그만큼 내게 더 어울리는 강변의 어둠으로부터 본능적으로 멀어지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나와 같은 익숙한 불행의 고리에 묶여 있는 듯한 이차은의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저항이 나를 이리로 향하게 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거기에 이르자 아무 구김 없어 보이는 형석의 삶에 이렇게 겁 없이 발을 들여놓은 지금, 과연 내가 이 남자의 세계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일지, 문득 겁이 났다.
이른 아침부터 형석이 차려주는 밥을 먹고, 같이 산책을 하고, 그의 농담에 웃기도 했지만 저녁이 되어 결심한 것은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던 내 속마음을 그에게 털어놔야겠다는 것이었다.
늦은 밤, 나는 조금의 용기를 내어 수상한 손님에 대한 말을 꺼냈다. 내가 어제 만난 사람은 누구이며, 그 사람과 관계된 어떤 사건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잠시 마음에 동정이 일었던 것도, 그리고 마지막 내 차가운 말을 마지막으로 이차은의 남편이 그 자리에서 사라진 모습까지 상세한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더불어 왜 그에게 연민을 느꼈는지에 대한 내 어린 시절의 이야기까지...
나는 불필요한 설명서를 내 보이는 것처럼 이럴 이유가 있는지 자문하면서도 형석에게만큼은 숨김이 없고 싶다는 충동이 앞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모든 얘기를 마칠 때쯤,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형석은 알고 있었다. 수상한 손님이 왜 매일 가게를 찾아왔는지, 은근한 그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이미 그 사람을 알고 있으며 어떤 의미로든 연결되어 있다는 것 까지.
“왜 물어보지 않았어요? 누굴 만나러 가는지?”
그는 알맞은 대답을 찾지 못한 듯 잠시 멈칫하다가
“그래도 당신이 빨리 돌아오길 바라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면서 조바심도 내고 불안하게.”
나는 형석의 이 말이 좋았다. 내가 결국 숨이 차도록 달려온 것은 순전히 이 남자 때문이구나. 거기엔 다른 의심을 섞어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리고 이제껏 내게 꺼내지 않은 말도 보탰는데, 그의 말을 듣고는 나도 모르게 두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사실 형석은 줄곧 도서관 구석자리에 앉아 책을 보던 나의 모습과 처음 아버지와 가게에 들어서는 순간, 주차장에서 난감해하던 어리숙한 모습까지 나와 마주친 사소한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고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직원을 구한다는 글을 가게에 붙인 첫날 내가 이력서 한 장을 들고 일을 하겠다며 내가 찾아왔을 때 그는 나와의 인연을 직감했다고 했다.
덧붙여 그는 내 의문에 답하길, 자신도 어두운 밤에 누구나 부러운 시선으로 들여다볼 만한 밝고 온화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 아닌 그저 보통의 사람이라 했다.
형석의 말대로 어쩌면 보통의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었다. 미친듯한 풍랑이 일었다가 어느새 바람 한점 없이 고요했다가, 높고 낮은 파고 모두를 담고 있는 바다와 같은 것 말이다. 그가 나의 고백을 애써 중화시키려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누구의 삶이 세트장의 물결처럼 한없이 쉽고 평탄하기만 할까? 또 어떻게 그것이 평균이고 보통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몇 주 후, 버스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빌딩 앞을 걷고 있는 이차은의 남편을 보았다.
정차했던 버스가 출발할 때, 고개를 돌려 그 사람을 보았지만 짧은 순간이나마 명확하게 그의 인상을 살필 수 있었다. 약간 고개를 숙이며 걷고 있기는 해도 절망적인 모습은 아니었던 그의 모습엔 뭔가 이전에 없던 힘이 느껴졌는데 생기라고 봐도 될 것 같은 어떤 분위기가 그를 세우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동안 나는 그를 염려하고 있었다. 그런데 더 이상 허상을 쫓아 배회하지 않고 그의 삶 속에 저렇게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렇게 엇갈린 짧은 순간 후로 나는 그 사람을 더 이상 마주친 적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