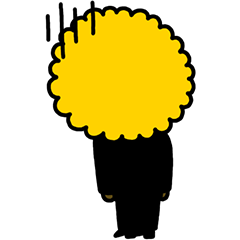9. 간병
평생 멀리하고 싶은 곳에서의 삶
보통 5-8인실 병실을 보고 닭장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 난 그보다 더한 닭장을 경험한 적이 있다.
지금은 그 병원의 치료환경이 얼마큼 좋아졌는지 알 수 없지만 그때 당시 내가 간병인으로서 경험한 무균실은 닭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너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약병들이 찰랑찰랑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매달려 있었고, 개인용 갑 티슈, 소독 스프레이는 항상 장착하고 다녀야 했다. 함부로 기침을 해서도 안됐고, 답답하다고 마스를 벗고 있어도 안됐다. 모두를 위한 일이었고 그렇게 해야만 했다.
엄마는 투병생활 초반에는 가끔 무균실에 가서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그 몇 번의 경험은 꽤나 인상적이었는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우선 입장을 하기 위해 무균실 전용화로 갈아 신는 것은 물론이고 헤어캡과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환경은 환자에게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가 덥고 답답했다. 그리고 무균실의 특성상 창문을 열 수 없다. 매일 새벽에 혈액 샘플을 채취해 가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 매일 항목에 맞게 개인 수첩에 기록을 해둬야 했다. 다양한 케이스의 환자들이 같이 생활하는 공간인만큼 간병인의 건강 관리 또한 필수였으며, 식사는 간병인들끼리 모여서 어디 비상계단 같은 곳에 가서 먹어야 했다.
우리 가족은 각자의 사정으로 평일에는 간병인을 뒀지만 주말에는 엄마의 부탁으로 언니와 내가 번갈아 가면서 간병을 했다. 엄마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특별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핸드폰만 가지고 노는 일도 많았다.
하지만 항암제로 인해 신체기능이 저하되면 간호사 선생님들께 확인받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했다. 급격하게 덥다고 느끼면 한층 내려가서 팩에 얼음을 넣어와야 하고, 몸에 오한이 들면 고무팩에 온수를 받아와서 껴안을 수 있게 베개 커퍼를 감싸줬었다.
나는 딱 한번 다른 간병인 분들과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다. 간병인의 밥은 따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환자 식사가 매 끼니마다 2인분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다 같이 환자가 먹고 남은 음식을 들고 올라가서 먹었다.
장기간 치료를 받는 환자의 간병인 분들 중에는 나처럼 가족도 있었고 아니면 주말까지도 상주하는 전문 간병인 분들이 있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무균실 생활이 익숙했던 나머지 집에 있는 개인 반찬까지 싸가지고 와서 펼쳐놓고 드셨다.
그곳은 전용 휴게실이 아니었다.
뭔가 통풍도 안 되는 협소한 곳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나는 너무도 불편했다. 다른 간병인 분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곳에서 식사를 하는 게 익숙해질 만큼 간병생활을 오래 하셨다는 것이 대단해 보였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병원에서 누군가를 돌봐주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다. 나는 엄마의 빠른 쾌유를 빌며 무균실에서 간병을 할 때는 1층 편의점에서 우유와 초콜릿으로 한 끼만 대충 때우는 방법을 선택했다.
엄마도 얼마나 답답했을까.
무균실 안에 환자 전용 화장실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는 집중치료 기간 동안에는 바깥구경을 하지 못했다. 물도 끓인 물만 마셔야 하고 모든 식사는 저염식이기 때문에 맛이 없었다. 멸균 우유에 최대한 자극적이지 않은 간식들. 일반병실로 가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도 없었다. 환자로서 세균 감염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거나 복도를 산책하는 것 외에는 병실을 벗어나는 일이 잘 없었다. 퇴원해서 집에 오면 몸과 마음이 한결 편안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온전히 건강 회복에만 집중할 수는 없었다.
아빠는 비교적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터라 정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평소에 약을 꾸준히 먹어주기만 하면 됐다. 아빠는 엄마가 우선이라는 생각 때문에 병원에서 혼자서 병원 치료받는 것에 대해 큰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스케줄은 온전히 엄마한테만 맞춰져 있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나의 첫 고등학교 여름방학이 다가왔고 집에 엄마도 있으니 안심하고 친구들과 방학숙제를 하러 나갔다. 말이 좋아 방학 숙제였지 빠르게 숙제는 끝내고 열심히 놀고 있던 찰나에 엄마한테 연락이 왔다. 집에 빨리 와야 할 거 같다고. 보통은 좋은 이유로 호출당하는 일은 없다.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긴장한 상태로 집에 들어갔다. 역시나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었고, 아빠는 거실로 언니와 나를 불러 앉혔다. 알고 보니 그날이 아빠가 퇴원하고 집에 오는 날이었는데, 어느 누구도 연락 한통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아차 싶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그때만큼은 아빠도 서운함을 감추지 못한 채 감정을 드러냈다. 한편으론 엄마를 계속 케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탱자탱자 놀고 있으면서 나 몰라라 했던 건 아니었다. 그래서 나의 개인 생활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화가 나고 억울하기도 했지만 자식 된 입장에서 형평성이 없었다는 미안함 때문에 입 꾹 다물고 훈계를 들었다.
지금의 아빠는 오래된 지병이 가끔 재발하는 것과 노환으로 인해 같이 병원을 가야 하는 일이 많아졌다. 언니가 임신하기 전까지는 가끔 언니 입원할 때 쫓아간 적도 있었다. 그래도 이만하면 다행이다 싶은 게 엄마 간병했을 때처럼 하루 종일 옆에 붙어 있다가 간이침대에서 쪼그리고 잘 필요도 없었고 씻지 못한 상태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집에 갈 필요가 없어졌다. 그리고 소독약 냄새와 알부민 냄새가 뒤섞인 곳에서 두통을 호소할 일도 없고 더 이상 엄마 눈치 보면서 날음식을 피하지 않아도 됐다. 언제 지금의 상황이 뒤바뀔지 모르지만 이만하면 불평할 게 없다.
나름 간병인 생활을 조금 해봐서 그런지 남을 돌보는 일에 약간 익숙하다. 하지만 여전히 병원은 익숙하면서도 어색하고 쾌적하면서도 불편하다. 나의 많은 슬픔이 서려있는 곳이기도 하고 기쁨과 절망이 오르락내리락했던 곳이다. 그래서 절대로 친해질 수 없다.